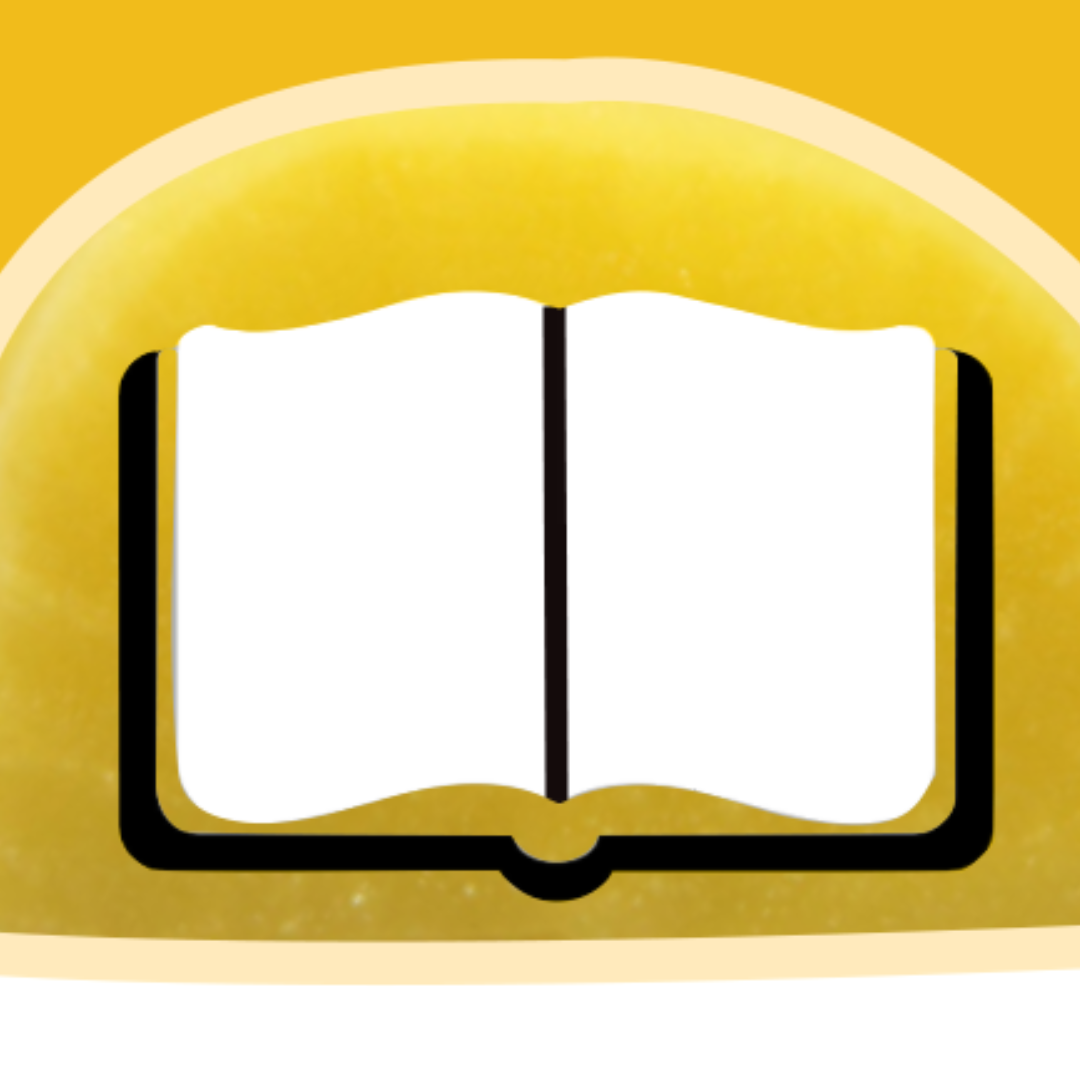6. 일본 한자의 음독과 훈독 한자어 ‘신용(信用)’은 중국어로는 신융, 한국어로는 신용, 일본어로는 신요라 읽는다. 발음은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한자를 쓰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의미가 통하는 단어들이 많다.오래전 한반도를 거쳐 6세기경부터 한자를 받아들인 일본은 지금까지도 가나 문자와 한자를 혼용하는 독특한 문자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사용되는 한자는 1949년 일본 정부가 간략화한 신자체(新字体)이다. 일본 문부성은 공식 문서나 교과서 등에 쓸 수 있는 표준 한자 목록(상용한자)을 만들었다.◉ 1949년 당용한자 1,850자 → 2010년 상용한자 2,136자초등학교 6년 동안 배우는 교육한자는 총 1,026자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쳐 상용한자 전반을 배우게 된다. 일본어..

5. 일본어 표기: 가나(かな) 일본에서 한자가 전해지자, 그걸 그대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읽는 방식’에 집중하게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만요가나(万葉仮名)다. ‘만요가나’는 『만요슈(萬葉集)』라는 시집에 많이 사용된 표기 방식이었는데, 한자의 뜻과 관계없이 소리(음훈)를 따서 일본어를 적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 만요가나에서 나중에 히라가나와 가타카나가 생겨나게 된다. 헤이안 시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은 두 가지 형태의 음절문자를 만들어낸다. 하나는 부드러운 곡선 형태의 히라가나(平仮名), 다른 하나는 직선적이고 간결한 가타카나(片仮名)다. ◉ 히라가나: 한자의 초서체를 줄여 만듦◉ 가타카나: 한자의 일부분(부, 변, 방 등)을 따서 만듦이 둘은 원래 ‘임시 문자’라는 뜻의 가리나..

4. 음절문자(音節文字) 인류는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시각적 언어를 발달시켜왔다. 가장 기초적인 형태는 그림문자였고, 이는 선사시대의 유물에서 흔히 발견된다. 아나톨리아의 히타이트 문자, 중미의 마야 문자, 태평양의 이스터 문자, 이집트의 상형문자 등이 대표적인 예다.하지만 그림문자만으로는 표현에 한계가 있었고, 이에 인류는 특정한 기호를 소리에 대응시키는 방법을 고안하게 된다. 이러한 기호는 그림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고, 더 이상 문자 하나가 단지 ‘뜻’만을 담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시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이후 인류는 언어의 모든 소리를 문자로 표현하려는 시도를 이어갔다. 이는 수많은 기호를 외우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

3. 한자어와 외래어 3-1. 외국어 vs 외래어 외국어는 외국에서 온 말 중 아직 우리말로 자리 잡지 못한 단어를 말하고,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왔지만 우리말 일부처럼 굳어진 차용어를 뜻한다. 예를 들어 영어로 말할 때 쓰는 ‘meeting’, ‘project’ 같은 건 외국어, 우리말 문장 안에서 “미팅 잡자”처럼 쓰면 외래어인 셈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걸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특히 언어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더더욱. 한자 문화권에 오래 속해 있던 한국은 대부분의 한자어를 외래어가 아니라 ‘한자어’로 따로 분류한다. 그러다 19세기 말 문호 개방 이후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외래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비슷한 문화적 흐름을 가진 일본도 8~19세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