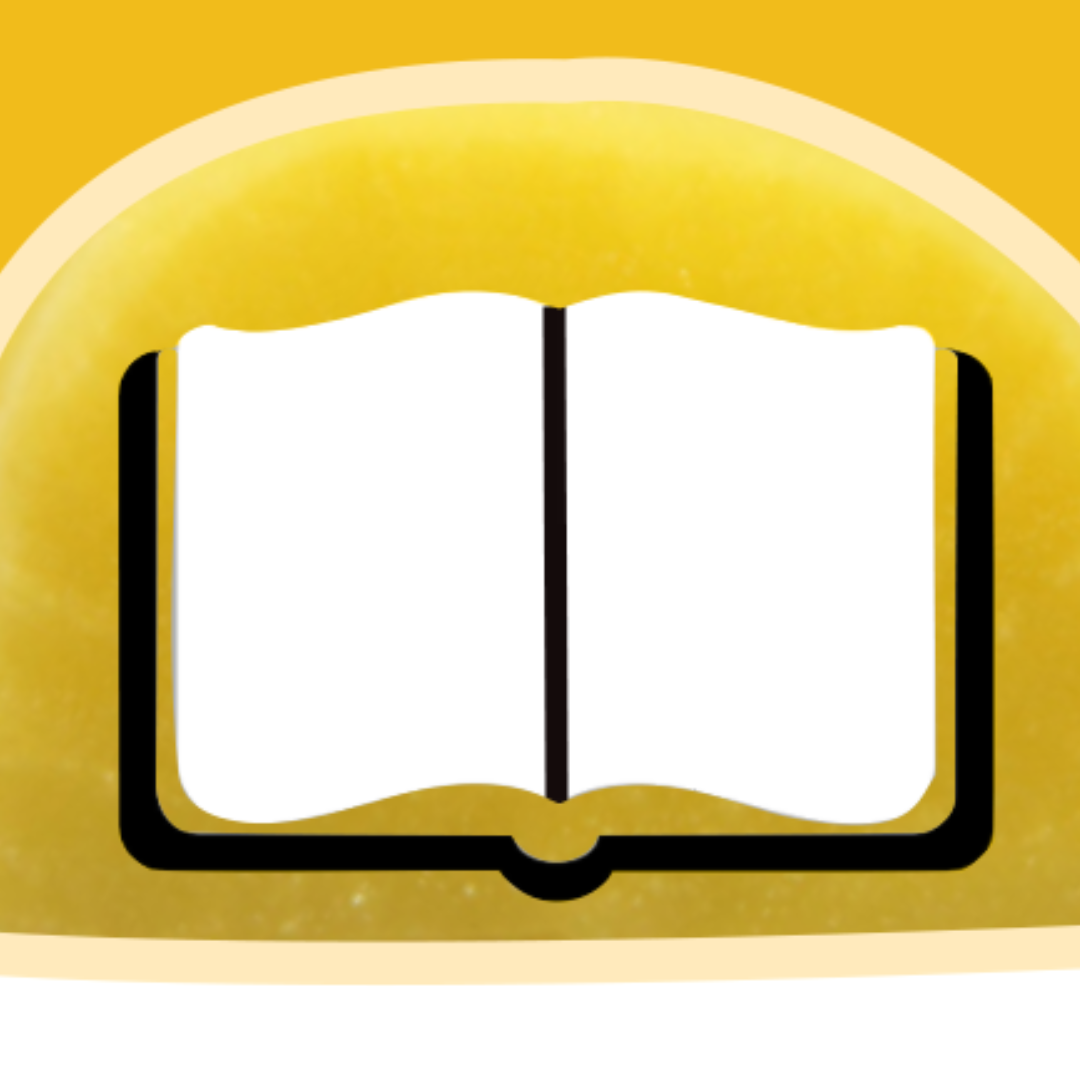5. 오타쿠(お宅)의 탄생
1983년, 일본의 만화 전문 잡지 《마이 아니메(My ANIME)》에 실린 칼럼에서 평론가 나카모리 아키오(中森明夫)는 당시 애니메이션과 만화에 몰입한 팬층을 조롱 섞인 어조로 묘사하며, 이들을 처음으로 ‘오타쿠(お宅)’라 명명하였다.
영양실조 같아 보이는 빼빼이거나, 안경의 은색 테두리를 볼살에 파묻어가며 웃는 흰 돼지이거나, 여자라면 단발머리에 대개는 뚱뚱하고, 통나무 같은 굵은 다리에 흰색 하이삭스를 신곤 한다. 보통 대는 교실 한구석에서 눈에 안 띄게 어두운 눈을 하고 친구 하나 없이…. 만화팬이나 코미케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영화의 공개 전날부터 줄서서 기다리는 놈, 카메라를 자랑하며 블루 트레인(일본의 침대열차의 별명)을 찍는다고 선로에서 깔려 죽을 뻔한 놈, 책꽂이에 옛날 SF 잡지랑 하야카와의 금은색 SF 시리즈가 나열되어 있는 놈이나 마이콘 숍에 우글거리는 우유병 바닥 같은 안경을 쓴 이과계 소년, 아이돌 탤런트의 사인회에 아침 일찍부터 가서 자리를 확보하는 놈, 유명진학 학원에 다니는 공부 빼면 동태눈을 한 겁쟁이가 되는 도련님….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오타쿠”라고 명명해, 이후 그렇게 부르도록 했다.(마이 아니메, 나카모리 아키오)
칼럼은 이들의 외모, 행동, 문화적 관심사를 풍자적으로 그려내며, 사회적 기준에서 벗어난 팬덤 문화를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이후 ‘오타쿠’는 특정 문화에 과몰입하고 사회적 관계에 서툰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확산되었다.

‘오타쿠(お宅)’는 원래 일본어에서 ‘집(宅)’을 높여 부르는 표현으로, 존댓말에 해당한다. 나카모리는 당시 젊은 세대가 타인을 부를 때 실제 이름 대신 ‘오타쿠’라고 부르던 경향에 착안해 이 용어를 차용하였다.
문화평론가 사와라기는 《리틀보이》라는 책에서, 이 명칭은 건축물로서의 ‘집’ 개념에 가까우며, 상호 간 거리감을 유지하는 의사소통 방식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로써 오타쿠는 단순한 말버릇을 넘어 하나의 세대 정체성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 단어는, 이러한 서브컬처 세대가, 상대방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오타쿠’라고 서로 부르던 것에서 유래한다. 그러나 서로를 ‘오타쿠’라고 부르는 것은 일본사회에서는 전혀 새로운 관습이 아니었다. ‘오타쿠’는 본래 ‘집(’집=宅(택)‘에 존칭형 접두사를 붙인 형태)을 의미한다. 물론, ’집‘이라고 해도, 이것은 ’가계‘와 같은 혈연적 연관을 나타내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건축물로서의 ’집‘. 그 자체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생각하는 게 옳을 것이다.(리틀보이, 사와라기)
5-1. 오타쿠에 대한 사회적 편견

1989년, 일본 사회는 오타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다. 미야자키 츠토무가 저지른 ‘도쿄 사이타마 연속 유아 유괴 살인 사건’은 언론에 의해 그의 취미 생활, 특히 비디오테이프 수집과 연결되었고, 오타쿠는 곧 사회적 부적응자이자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 오타쿠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숨기며 은밀한 활동을 지속했고, 일본 사회 전반에 오타쿠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퍼졌다.
1990년대에는 ‘오타쿠 평론가’를 자처한 타쿠 하치로(宅八郎)가 등장한다. 그는 흐트러진 긴 머리, 안경, 아이돌 피규어를 소지한 모습으로 방송에 등장해 대중의 시선을 끌었다.
그의 등장은 오타쿠 문화의 전형적 이미지로 소비되며 일종의 ‘문화적 희화화’를 야기했지만, 오타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체를 바꾸는 데는 제한적이었다. 심지어 NHK는 2008년까지도 ‘오타쿠’라는 단어를 방송 금지어로 간주했다.
한국에서도 ‘오타쿠’는 초기에는 ‘덕후’ 또는 ‘오덕’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번역되었으며, 특이하거나 사회적 기준에서 벗어난 취미를 가진 사람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등 일본발 서브컬처가 대중화되었고, ‘오타쿠’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어떤 분야에 깊이 있는 애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재해석되었다.
오늘날에는 IT, 과학, 예술,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덕후’라는 표현이 사용되며, 이는 전문성과 열정의 상징으로 인식되기도 한다.